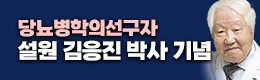유해물질은 어떻게 피부의 그물 구조를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 답은 피부의 세라마이드(세포간 지질)에 있다. 먼저 세라마이드와 화학물질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피부 표피는 '표면의 각질 세포, 세라마이드, 표피 세포' 와 같은 샌드위치 상태로 되어 있다. 표면에 있는 피지막은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이 함께 섞여 만들어진 지방산, 스쿠알렌, 왁스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마치 벽돌 같이 생긴 각질 세포 속에는 수분이 가득 차 있다. 이 수분은 NMF(Natural Moisturizing Factor)로, 천연 보습 인자로도 불린다. NMF는 요소나 아미노산, 피로리돈카르본산나트륨, 젖산염 등 약 20종류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모든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각질층 속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우고 있는 주요 성분이다. 각질층은 종종 벽돌벽에 비유되곤 하는데, 벽돌 사이의 틈을 잘 붙게 해주는 것이 세라마이드인 것이다. 세라마이드는 각질층의 세포간 지질의 50%를 차지하고 스핑고 지질이며, 각질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기도 하다.
각질층 속은 이렇게 피질막, NMF, 세라마이드의 3가지 작용으로 인해 수분으로 촉촉한 상태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보습 기능' 이다.
그렇다면 차단 기능은 어떨까? 차단 기능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세라마이드이다. 각질층에 존재하는 세라마이드는 7종류의 구조로 되어 있다. 세라마이드는 구조상 기름과 친한 부분(소수기)과 물과 친한 부분(친수기)이 있어 수분을 안쪽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구조식' 이다. 이를 계면활성제인 스테아린산나트륨의 구조(90쪽 참고)와 비교해 보도록 하자. 그림을 살펴보면 매우 닮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스테아린산나트륨이란 이른바 '비누' 를 말한다(비누도 계면활성제의 일종이다). 이처럼 세라마이드의 구조는 경피독 물질의 구조와 많이 비슷하다. 또한 벤젠 고리(거북이 등딱지)가 붙어 있는 것은 직쇄형 알킬벤젠술폰산나트륨(LAS)과 많이 닮았다.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은 서로 친해지기 쉽다는 뜻이다. 즉, 피부 표면에 있는 세라마이드에 계면활성제가 들어와 서로 녹게 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피지의 성분 | NMF의 성분 | 세라마이드의 성분 |
스쿠알렌 10% | 아미노산류 40% | 지방산 20% |
트리글리세리드 25% | 미네랄 18.5% | 콜레스테롤에스테르 10% |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 10% | 피로리돈카르본산 12% | 콜레스테롤 15% |
왁스 22% | 젖산염 12% | 세라마이드 50% |
지방산 25% | 요소 7% | 당(糖) 세라마이드 5% |
콜레스테롤에스테르 2.5% | 기타 10.5% |
|
콜레스테롤 1.5% |
|
|
기타 4% |
|
|
경피독은 합성화학물질에 관한 문제인데, 피부의 세라마이드도 합성화학물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아무리 계면활성제와 세라마이드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도 정상적인 각질 세포들이 벽돌처럼 잘 쌓아 올려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힘들다.
반면, 피부가 건강하다고 해도 세라마이드들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다면 적은 양이라도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경피독이 피부르 뚫고 들어오는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잇는 것이다.
크기나 형상도 원인이 된다. 예컨대 커다란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각질 세포가 보습 성분으로 충분한 상태라면 틈이 작기 때문에 뚫고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진다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방향이나 형태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다. 때문에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피부뿐 아니라 세포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 차단 기능이 있어 분자량이 500 이상인 커다란 물질은 들어오지 못한다. 하지만 경피독으로 여겨지는 합성계면활성제인 프로필렌글리콜의 분자량은 76.1, 라우릴황산나트륨의 분자량은 288.4로 매우 작다. 따라서 형상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계면활성제는 세포막이나 세포 틈새로 들어오게 된다.
이외에 경피독이 피부막을 통과하기 쉽게 만드는 또 다른 경우도 있다. 바로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층의 차단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변화하면서 턴오버를 반복하면, 표면에 튼튼한 각질층이 생겨서 피부에 차단벽이 만들어지고 경피독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피부를 문지르거나 할퀴거나 하면 각질이 얇아지고, 피부 표면이 갈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차단 기능은 약해진다.
유해화학물질은 이렇게 피부에 생긴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 온다.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들어오기 더 쉽다.